현지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역 정통한 전문가 육성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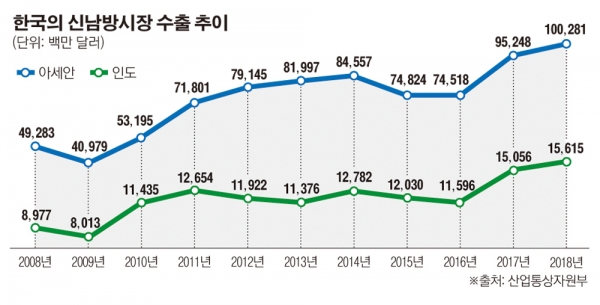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기존엔 미국, 중국 등 슈퍼파워 사이에서 성과를 냈지만 이제는 신흥 지역으로 관계망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한국이 중견 국가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남방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외교 관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철 부산외대 인도학과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 교수는 “한국이 그간 추구해온 통상 전략은 이제 글로벌 경제침체와 미·중 분쟁으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등 소수 국가에만 의존했던 통상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인도, 동남아시아는 우리 생각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신남방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인도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 초기 단계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일단 시장에 들어가면 진입장벽이 우리 기업의 성장을 돕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이 교수와 이 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현지 진출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남방 시장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은 경계했다. 이 교수는 ‘네트워크 리스크’를 꼽았다. 사업 성공을 위해 어떤 현지 파트너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남방 시장에 덤볐다가는 ‘백전백패(百戰百敗)’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신남방 시장은 결코 아름답기만 한 시장이 아니다. 준비 없이 불쑥 진출했다가는 무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 같은 경우 이미 ‘오버캐파(over capacity·과잉 설비)’ 상태다. 기업이 더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며 “현지 진출에 앞서 시장에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대외 충격에 취약한 신남방 국가들의 경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지역은 경제 규모가 작고 미국, 중국 등 선진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발주가 적어져 물건을 팔 데가 없어지면 난감한 일 아니겠냐”며 대내적 리스크로 법적·제도적 미비를 꼽았다. 그는 “제도 정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 제도적 안정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남방 시장에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교수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면 비즈니스 포럼, 미팅 등 (한국 기업인과 현지 관계자가) 서로 자주 만날 필요가 있다”며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산업부가 최근 이런 행사를 자주 마련하긴 하는데 단발성으로 끝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정확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시장에 대한 얇고 넓은 지식을 갖춘 제네럴리스트는 한국에도 많지만 현지 사업에 필요한 세부 분야를 깊이 아는 스페셜리스트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숲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충분하다. 이제는 나무를 관리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사업장과 현지 사업장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현지에서 못 만드는 부품은 보내주고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그곳에서 만들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지에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국가 차원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237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