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매수자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런 심리를 잘 아는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기 일쑤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가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자극한 탓이다.
종부세 위력도 ‘찻잔 속의 폭풍’에 그치는 모양새다. 얼마 전에 날아든 종부세 고지서에도 “버틸 만하다”,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다.
예년보다 많이 오른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다 팔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시장에선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꺼내들 카드가 마뜩잖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종부세 강화(공시가격 현실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정도다.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30년→40년)도 거론된다. 모두 수요 억제책이다.
시장 반응은 ‘그러거나 말거나’다. 예전에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지금은 콧방귀도 안뀐다. 주변을 살펴봐도 집을 가진 사람은 느긋하고 무주택자는 집을 못 사 안달이다. 한마디로 규제 시그널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잇단 부동산 대책에 내성((耐性)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한 달이 멀다하고 집값 안정 대책을 쏟아냈지만‘반짝 효과’에 그쳤던 탓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도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정부의 ‘뒤죽박죽’ 정책도 한몫했다. 한쪽에서는 강남 주택시장에 족쇄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다른 쪽에선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식이다.
엇박자 정책의 백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자사고 폐지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강남권을 위주로 한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사고·외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군 좋은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과 목동 등 우수 학군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는 매매값은 물론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정서는 ‘조롱’ 그 자체다. “정부가 규제한 곳은 투자 추천 지역”이란 말도 공공연하게 나돈다. “손만 대면 오른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미다스의 손’에 빗댄 글도 부동산 카페 등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어쨌든 정부는 추가 규제 대책을 또 꺼내들 태세이지만, 시장의 눈은 수급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시장에서는 공급 축소 신호로 읽고 있다는 얘기다. 공급 절벽 공포감이 짙게 깔린 이상, 수요 억제책은 적절한 조치가 되기 힘들다. 수요자의 조급함을 부추겨 매수세만 강해지게 할 뿐이다.
서울은 재개발 구역과 재건축 단지 외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을 막으니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야 임대주택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건 삭풍이 아닌 햇볕이다.
집값을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길을 터주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 특히 수요에 상응하는 넉넉한 공급보다 시장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집값을 잡는 지름길을 마다하고 왜 먼길로 돌아가려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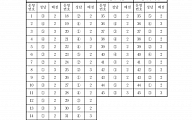







![[정치대학] 박성민 "尹대통령, 권위와 신뢰 잃었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101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