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 촉진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원금 보장과 관련해 국민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정부 방침에 대한 시장의 문제제기와 ‘관제(官制) 펀드’의 실패 우려가 잇따른다. 여기에 재정의 손실부담 비율을 놓고서도 정부의 입장에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성될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 가운데 35%인 7조 원이 정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하는 모(母)펀드라고 밝혔다. 모펀드는 은행·연기금 등 민간이 매칭하는 나머지 13조 원의 자(子)펀드에 대한 후순위 출자자로서 자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우선 흡수하는 구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처음 35%까지의 펀드손실을 재정이 떠안고 수익률도 국고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본시장 왜곡과 국민세금으로 펀드 손실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다시 정부의 손실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 재정에서 후순위는 2조 원이고, 나머지 5조 원은 중(中)순위, 또는 후순위로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손실부담 비율에서 혼란을 불러왔다.
정부는 재정이 후순위로 위험부담을 안는 것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위험부담률 10%),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7.5%) 등의 전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안전장치로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이다.
뉴딜펀드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많다. 정부 주도로 야심차게 시작한 펀드로 반짝 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정권 임기가 끝나면서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수익률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등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과 그린의 신산업에 집중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제 펀드와 차별화된 강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사업의 성장성과 지속성이 높아 수익률 전망도 밝다는 얘기이지만 아직 희망사항이다.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히 큰 이유다. 펀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결국 수익성이다. 돈은 사업의 미래 발전성의 기대를 좇아 움직인다. 정부가 관제 펀드를 만들어 앞장서지 않아도 이익이 나는 쪽으로 돈은 몰리게 돼 있다. 한국판 뉴딜의 수많은 사업이 선택과 집중 차원의 범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안 돼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 프로젝트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많다.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면, 우선 규제가 만연해 투자환경이 결핍된 상태부터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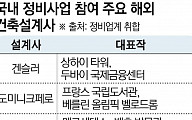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