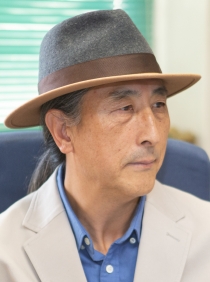
그렇다면 이야기꾼 스필버그의 제네시스는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형성돼 왔을까? 영화의 도입부 시퀀스는 의미심장하다. 1952년 1월, 당시 6세 유소년은 부모와 함께 처음으로 영화관에 간다. 거대한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열차의 충돌은 압도적인 생동감과 충격 그 자체다. 그것은 아이의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커다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 덕에 8mm 홈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상황을 직접 통제·연출, 기록·재현함으로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대상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이후 소년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잦은 이사, 학교에서의 인종차별과 린치, 부모의 이혼 등, 크고 작은 상처의 치유와 극복 과정을 통해 단련을 받고 단단해진다. 모름지기 모든 사건(event)이란 ‘무언가 일어나는 일(thing that happen)’이고, ‘모든 (일어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고 하는 산교육도 이루어진다. 소년은 직접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로부터 최상의 연기를 끌어내는 방법, 극적 사건의 시간성과 인과관계는 이야기를 촘촘히 엮어가는 씨줄과 날줄이 됨을 터득한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가족의 실존적 삶은 연출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좌절하기도 하고, 유대인 차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동기를 찾으며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한 찰리 채풀린의 잠언처럼, 삶의 희비극 속에서 소년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공을 다져나간다.
엔딩 시퀀스에서, 어느덧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20대 초반의 청년은 우상인 존 포드 감독(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카메오 출연)과 대면한다. 그 장면에서 운위되는 지평선(horizon)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영화의 화각, 즉 카메라 앵글에 한정된 지적이 아니다. 그것은 영화감독의 흔들림과 균형잡기, 다시 말하면 작품성과 예술성, 상업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로 환치해 볼 수 있다. 존 포드 감독은 일찍이 ‘감독이 작품을 통해 예술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흥행(상업적)에서 실패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업영화 제작 현장에서 감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고 경계다.
지난 봄, 이 영화의 개봉 전후에 영화 전문 팬매거진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획 특집을 펼쳤고, 그 영향으로 평단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많은 글을 쏟아냈다.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으며 제80회 골든글로브 감독상과 작품상, 제47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했다. 그에 비해 국내 흥행성적은 놀라울 만큼 초라했다. 작품 속에는 영화의 본질에 대한 노 대가의 철학, 통찰, 모범적인 전형들이 두루 포함돼 있다. 평생 단짝인 존 윌리엄스의 음악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포인트다. 영화광, 영화학도, 감독을 꿈꾸는 젊은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하고, 전공영화로 삼을 만한 교과서적 작품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151분. 국내개봉 2023. 3. 22. 관객수 8만767명).










![[정치대학] 美 대선, 막판까지 초박빙…당선자별 韓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81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