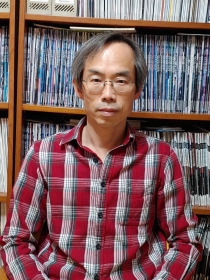
“빈대 좀 그만 붙어라”는 표현도 그런 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또 다른 표현에서 빈대가 벌레라는 건 짐작하겠지만 정작 빈대를 본 적도 없고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다. 50대인 필자 역시 빈대를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어머니에게서 빈대에 물리면 엄청나게 간지럽다는 얘기를 듣고 체외 기생충의 하나라고 아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여름 갑자기 빈대가 뉴스에 등장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가 빈대로 골치가 아프다는 내용이다. 파리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면서 자칫 큰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민자나 난민 또는 여행자에게서 딸려 온 것으로 보이는데, 퇴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이때 TV 화면에서 빈대를 처음 봤는데 상당히 혐오스러웠다. 물론 쌀알만한 크기라 실물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별일이다 싶었는데 웬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대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나왔다. 인천의 한 사우나와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발견됐는데,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러다가 전국으로 퍼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요즘 소위 선진국들에서 빈대가 다시 나타나는 걸까.

박쥐에서 사람으로
빈대가 속해있는 노린재목(목(目)은 분류의 한 단계다) 곤충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뾰족하고 기다란 주둥이로 식물의 수액이나 동물의 체액을 빨아먹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매미는 유충일 때는 뿌리에서, 성충이 돼서는 줄기에서 수액을 빨아먹는다. 빈대류는 동물의 혈관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 곤충이다.
빈대가 언제부터 사람의 피를 먹이로 삼았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만~수십만 년 전 동굴에 살던 인류가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굴의 원 거주자인 박쥐에 기생하던 빈대가 새 입주자인 사람과 접촉하면서 진화를 거듭해 사람을 숙주로 삼는 기생충으로 거듭났다는 시나리오다. 참고로 가장 오래된 고고학 증거는 약 3500년 전 이집트 도시의 유물에서 발견한 빈대다.
실제 사람 빈대는 박쥐 빈대와 꽤 비슷하면서도(따라서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다) 주둥이가 약간 더 넓어 박쥐 적혈구보다 약간 큰 사람 적혈구가 쉽게 통과할 수 있고 다리도 좀 더 길어 사람에게 걸리면 도망쳐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였다. 또 생체리듬도 바뀌어 주행성(박쥐는 밤에 나가 먹이활동을 하고 낮에 동굴에서 쉬므로)에서 야행성이 돼 낮에는 사람의 눈에 안 띄는 곳에 숨어 있다가 밤에 잠자리에 누운 사람에게 다가간다. 영어로 빈대를 bed bug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침대 벌레로 이런 생태를 정확히 담았다.
다만 빈대는 추위에 약해 인류가 동굴을 벗어난 뒤에는 근근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인류가 농업을 발명하고 정주하면서 난방기술 발달과 함께 빈대도 번성했다. 20세기 중반 들어 DDT로 상징되는 살충제가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지역에서 빈대가 자취를 감췄다. 그럼에도 빈대는 세계 곳곳에서 살아남았고 2000년대 들어 지구촌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하고 살충제 내성을 지닌 빈대가 나타나면서 다시 세계로 퍼지고 있다.
빈대는 생김새도 징그럽지만, 피를 빨린 자리가 견딜 수 없이 가려워 모기에 물린 뒤 가려움은 비교도 안 된다고 한다. 이는 빈대의 타액 성분이 인체 면역계를 자극해 감작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오기도 한다. 빈대는 한 번 빨대를 꽂으면 약 8분 동안 자기 몸의 두세 배 양의 피를 먹는다. 이는 모기 흡혈의 7~10배에 이르는 양이다.
빈대의 타액은 흡혈을 돕는 단백질이 46가지 이상 들어있는 칵테일이다. 각 단백질은 피의 응고를 막거나 혈관을 확장해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진통 효과로 사람이 피를 빨리는 걸 모르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모기나 진드기와는 달리 빈대는 병원성 미생물을 옮기는 매개체는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빈대를 쫓는 주문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 역시 빈대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를 잡으려다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속담까지 나왔을까 싶다. 빈대 출몰 뉴스가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찐코노미] 테슬라, 진정한 성장 시작되나…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826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