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최근 급증
부실 끊어낼 금융당국 감시 강화 해야
2003년 쯤으로 기억한다. 기자가 저축은행을 출입하던 당시, 업계 화두는 단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였다. 소액 신용대출이 돈 벌이였던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 조치를 내리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다. 마침 주택 시장이 살아나면서 PF가 활기를 띄었다.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까지 대다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에 뛰어 들었다. 사금고를 연상시키는 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꾼 지 일 년밖에 되지 않았던 터라 ‘푼 돈 대출’ 이미지보다 더 매력적이었던 데다 돈 벼락을 안겨준다는 기대감에서였다.
하지만 거품은 꺼지기 마련.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실이라는 부메랑이 돼 업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부동산 경기만 믿고 토지 확인도 않고 사업을 따온 시행사들에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들은 착공이 지연돼 PF 대출이 연체되면서 그대로 무너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들을 지옥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2011년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7곳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두 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상태였다. PF 열풍에 무리한 PF 대출과 불법 대출, 대주주의 전횡 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물론 지금의 저축은행은 그 때와는 분명 다르다. 대주주의 전횡이나 불법 대출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 사태로 시작된 PF 부실은 20년 전 공포를 되새기게 한다. 위기의 징후들은 수차례 포착됐었다.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은 치솟았고 부실 경고등은 곳곳에서 깜빡였다. 태영건설 위기설도 이미 지난해 여러번 돌았다. 태영 측도 정부도 문제가 없다고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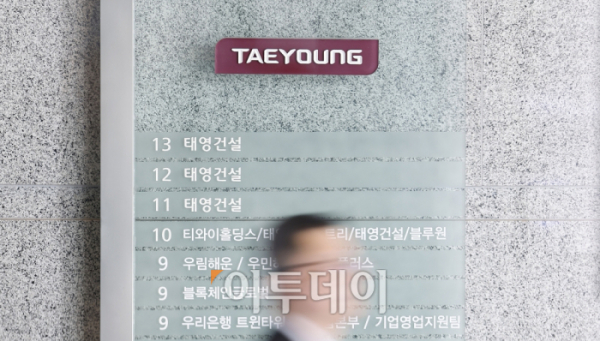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었던게 불과 1년 전이다. 레고랜드 사태도 부동산 시장 악화에 PF 대출 길이 막히면서 지방정부가 채무 유예를 선언했고 시장을 공포로 몬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작년 12월에만 건설사 10여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받았다. 새해 들어서도 인천 영동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이 수십억 원의 차입금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매달 1∼2건 수준이었던 건설사 부도업체 수가 작년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다. PF 고금리와 개발 중단 등이 지속되면 중소 건설사의 줄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게 시장의 관측이다. 다행히 태영건설의 위기는 금융당국의 태영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통하며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다.
이처럼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건설사의 도산은 PF에 집중한 증권사나 캐피탈사에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한 PF 사업을 빨리 정리 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시장 상황이 반전될 때 까지 시간 끌기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정리도 좋고 구조조정도 좋은데 반복되는 PF 부실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과거의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옥석가리기를 위한 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시장이 좋아지면 PF 대출이 쏟아지고, 위기가 오면 민간 부실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일을 국민들이 언제 까지 참아줘야 하겠나.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92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