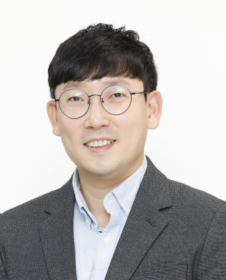
제조사들은 3D 기능이 TV 시장의 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봤지만, 거기까지였다. 3D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안경을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발목을 잡았다. 3D 안경을 착용하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문제도 불거졌다. 일반 TV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도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했다. 3D 콘텐츠의 양과 질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서 한때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던 3D TV 점유율은 2016년 8%까지 곤두박질쳤다.
인기가 시들해지자 TV 제조사들은 발을 뺐다. 삼성전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3D TV 신제품 출시를 중단했다. LG전자와 소니, TCL 등 다른 TV 제조사들도 신제품에서 3D 기능을 잇달아 제외했다. 3D TV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졌다. 차세대 TV 선두주자였던 3D TV는 한순간의 유행을 이끌었던 반짝 제품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애플은 혼합현실(MR) 기기 ‘비전 프로’를 내놨다. 비전프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더해 만든 MR용 헤드셋이다. 고글 형태의 기기를 착용하면 현실 세계 위로 거대한 화면이 나타나고 3D 콘텐츠가 눈앞에 띄워진다.
사실 VR과 AR 기기는 비전프로가 처음은 아니다. 2012년 구글이 AR 기기 구글 글래스를 공개한 바 있고, 메타는 2016년 ‘오큘러스 리프트’를 시작으로 VR 헤드셋 시장에 진출한 후 지금까지 퀘스트 시리즈 헤드셋을 꾸준히 내놓으며 시장을 개척해왔다.
그러나 시장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VR·AR 기술을 개발하는 메타의 리얼리티랩스 사업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중이다. 머리나 얼굴에 뭐를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이 시장의 성장을 막았다.
애플 비전프로도 마찬가지다. 다른 제품보다 가벼워졌다곤 하지만, 비전프로의 무게는 저장용량에 따라 600~650g이다. 고기 한 근을 뒤집어쓴 채 장시간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듯하다.
실제로 제품을 샀다가 반품하는 경우도 많다. 애플 전문가로 꼽히는 마크 구먼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일부 소규모 매장에서는 하루 1~2회 반품이, 대규모 매장에선 8회 이상의 반품이 이뤄졌다”고 했다. 반품이 물밀 듯이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충성팬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명백한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고객 상당수는 ‘장치가 너무 무겁고, 관리하기 번거로우며 두통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비전 프로를 반품했다. 3500달러(약 468만 원)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반품 이유였다.
어디서 본 듯한 문제점들이다. 3D TV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가 모두 들어있는 셈이다. 비전프로가 3D TV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헤드셋이 아닌 콘택트렌즈 형태로 구현하거나, 그 가격을 주고 살 만큼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냉정하다.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한 애플이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는 없다.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