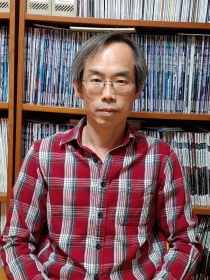
척추동물의 배아발생 과정을 비교해보면 꼬리뼈라는 이름이 적절하다. 사람 역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배아 단계에서는 꼬리 형태가 존재하지만 배아 말기(임신 8주)에 사라진다.
이때 다른 동물에서는 꼬리를 이룰 척추 말단의 뼈 4~5개가 합쳐지면서 퇴화한 게 미골, 즉 꼬리뼈다. 이처럼 진화과정에서 기능을 잃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기관을 흔적 기관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꼬리뼈와 비슷한 게 고래의 뒷다리뼈다. 수천만 년 전 뭍에서 바다로 간 고래의 조상은 네 다리로 걷는 육상 포유류였다. 그 뒤 수중 생활에 맞춰 진화하면서 앞다리는 가슴지느러미 형태로 바뀌었고 뒷다리는 사람의 꼬리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조그마한 뒷다리뼈는 뒷다리가 나올 자리에 흔적 기관으로 남아있다.
꼬리가 없는 게 사람만의 특징은 아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유인원, 즉 침팬지와 고릴라, 오랑우탄도 꼬리가 없다. 꼬리가 사라진 건 영장류에서 유인원이 갈라져 나온 약 2500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의 배아발생에서 꼬리가 사라지고 꼬리뼈가 형성되는 과정 역시 사람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왜 초기 유인원에서 꼬리가 사라졌을까.
꼬리의 기능은 다양하다. 물고기나 악어의 꼬리는 물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추진력을 낸다. 맹수류의 긴 꼬리는 전력 질주할 때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원숭이는 긴 꼬리를 팔처럼 써서 나무에 매달리기도 한다. 소의 꼬리는 귀찮은 곤충을 쫓는 파리채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척추를 곧추세워 두 다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골격 형태를 지닌 유인원은 꼬리의 존재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퇴화해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다.
수년 전 과천대공원에서 긴팔원숭이의 움직임을 보며 이 가설을 수긍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름과 달리 긴팔원숭이는 유인원(ape)이지 원숭이(monkey)가 아니다. 나무와 밧줄을 적절히 배치해 열대 밀림을 모방한 공간에서 긴팔원숭이는 말 그대로 긴 양팔로 마치 곡예사처럼 빠르고 우아하게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직립한 상태이고 중간중간 멈출 때는 나무 위에 두 다리로 섰다. 꼬리가 있다면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지난주 학술지 ‘네이처’에는 사람과 유인원에서 꼬리뼈가 사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전 변이가 밝혀졌다. 태아 발생 과정에서 꼬리 형성에 관여하는 TBXT 유전자 중간에 DNA 조각이 끼어들면서 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제 기능을 못 하면서 꼬리가 될 부분이 퇴화해 사라진 것이다. 연구자들은 생쥐의 해당 유전자에 같은 변이를 유발해 꼬리가 짧아지거나 사라지게 해 이를 증명했다.
게놈이 밝혀진 영장류 종들의 TBXT 유전자 염기서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유인원만 사람과 같은 위치에 같은 DNA 조각이 끼어들어 있다. 꼬리가 사라진 게 약 2500만 년 전 현생 유인원의 공통 조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그런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흥미롭다. 논문의 제1저자인 보 시아는 수년 전 미국 뉴욕대 박사과정 학생일 때 택시를 서둘러 타다가 꼬리뼈를 심하게 다쳤다. 병실에서 회복하던 중 문득 ‘사람은 왜 꼬리가 없지?’라는 궁금증이 생겨 알아봤고 TBXT 유전자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아는 하던 연구를 접고 TBXT 유전자 변이가 원인임을 밝히는 연구에 뛰어들어 대발견을 한 것이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열렬한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라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 문득 떠오른다.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922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