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순식간에 파괴’ 경고
정부, 시스템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허리케인이 연례행사처럼 미국을 휩쓸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에 ‘헐린’ 피해가 막대하긴 했지만, 기후변화와 연관 지어서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할 만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안이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헐린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가 기후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따르면 최근 8년간 ‘헐린’을 포함해 총 8개의 4등급 또는 5등급의 허리케인이 미국에 상륙했다. 이는 이전 57년 동안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수와 같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산호초 감시 데이터를 살펴보면 ‘헐린’이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을 지났을 때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약 1~2도 높았다고 밝혔다.
기후학자들은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대기 중 수분이 7% 더 많아지고 그만큼 강수량도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허리케인이 더 빠르게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게 된다. 일례로 ‘헐린’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위력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아졌다.
올해 초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마이클 F. 웨너와 NOAA의 제임스 P. 코신 허리케인 분야 연구원은 “기후변화가 허리케인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의 5등급 분류 체제는 부적절하다. 6등급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기존 시스템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번 허리케인이 주는 경고는 이것만이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은 이번에 가장 피해를 본 곳 중의 하나다. 허리케인 사망자 중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최소 30명이 애슈빌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문제는 애슈빌이 역사적으로 온화한 기후와 더불어 내륙 산간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기후피난처’로 손꼽혔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애슈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흔히 발생하는 산불이나 해안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뒤흔드는 폭풍을 겪지 않아 여러 매체에서 기후피난처로 주목했다”며 “이제 사람들은 기후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주는 의미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사람들이 누려왔던 삶의 기반이 기후변화로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재해가 상기시킨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대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일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꼽으면서 내세우는 것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전기차와 태양광 등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지구온난화 대처’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 곳곳에서 허리케인과 홍수로 도심이 잠기고 강물에 자동차가 떠내려 가거나 폭염에 따른 산불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한층 심각해지는데 청정경제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국가의 모든 정책은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의식으로 시스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지금처럼 안이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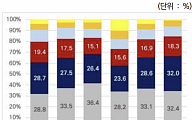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59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