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사는 물론 각종 칼럼에서도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다.
그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작된 논란은 조만간 사그라들 줄 알았다. 삼성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금방 만회하고 따라잡을 줄 알았다.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의심하지 않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삼성전자 HBM을 조만간 채택, 활용할 것처럼 냄새를 풍겼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미뤄졌다. 의심에 힘이 실린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지만,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다. 6만 원 전후를 오르내리며, ‘5만 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시장의 기대치, 특히 미래 경쟁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HBM을 넘어 10년 넘게 독보적 1위를 달려온 D램의 경쟁력까지 의심받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도 하나둘씩 늘고 있다.
가장 최근 들은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인력 유출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2명의 엔지니어를 뽑는데 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출신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외 인력 유출은 더 심각하다.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은 물론 중국 기업으로 이미 상당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동안 쌓아 올린 자산이 순식간에 경쟁사의 무기가 되어 되돌아오는 상황이다.
급기야 14일에는 전직 장관들이 모여 반도체 산업의 위기, 특히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을 조언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만든 특별 대담 자리였다. 제목에서부터 가지고 있다가, 뺏겼다는 의미가 담긴 ‘탈환’이 들어 있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 반도체 전문가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현재 기술에 기반을 둔 D램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 전환을 의미한 발언이지만, 속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독보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문제는 이런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원책이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지난해 1년 동안에만 미국은 85억 달러, 일본은 63억 달러를 반도체 기업에 직접 지원했다. 중국은 아예 국영기업을 보유해 별도 투자금을 꼽는 게 무의미하다.
반면 우리 기업은 지원금은 고사하고,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될지 걱정하는 처지다.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전히 해결은 오리무중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다. 아이의 소중함을 강조한 말이고, 그런 소중한 존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리 반도체 산업은 현재와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단순히 하나의 산업,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더는 아이에게 알아서 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며 크게 다섯 가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 반도체 산업 전력 수급 현안 해결, 세액공제율 상향 및 범위 확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강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이다. 답은 이미 알고 있다. 왜 안됐는지를 찾고, 실행하면 된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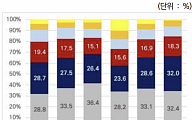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59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