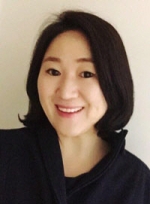
얼마 전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까지 68조 원(-7.06%)이란 거액 손실을 냈다는 뉴스에 또 한 번 뚜껑이 열렸더랬다. 한국 경기가 침체에 빠져 시장이 허우적거리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다니.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노르웨이(-18.2%), 네덜란드(-16.6%), 캐나다(-6.8%), 미국(-15.9%), 일본(-3.8%) 등 주요국 연기금에 비하면 그나마 양호한 성적표라며 자기 위안을 한다. 언제부터 연기금 투자가 상대 평가였던가.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25.47%와 7.53%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해외 주식에서는 9.52%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해외 채권에서는 6.01%의 양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손실이 컸던 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비중이 컸던 탓이다. 국민연금은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와 달리 국내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 수익률 현황을 보면 전체에서 국내 투자는 주식이 33.8%, 채권이 13.6%로 50%에 육박한다.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자산 비중이 크다는 건 한국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국내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면 수익률도 긍정적이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치권과 국민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최고의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작년 3월 초까지 48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자 시장에서는 비난이 빗발쳤다. 주식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약 15조 원 규모의 주식을 털었더니 “코스피지수 상승 발목을 잡는다” “하필 왜 내 종목을 파느냐”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원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자산을 추가하려는 장기 목표의 일환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 비율을 21.2%에서 16.8%로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중의 압력에 굴복해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의 허용 가능한 투자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었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부문이 출범한 이후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건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뿐이었다. 문제는 백 번을 잘해도 한 번 삐끗하면 그 인식이 박힌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1990년생 이후부터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싱크탱크 전망이 나온 상황. 대부분의 국민은 납부 기간과 수급 시점이 둘 다 미뤄지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이 새 정부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55세여서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꿔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은 역대 정권마다 상존했다. 그만큼 난제여서 누구든 섣불리 손대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2023 새해 화두로 연금, 노동, 교육 등을 3대 개혁 과제로 두고 드라이브를 건다고 한다. 임기 2년 차부터 지난(至難)한 시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연금 개혁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일이고, 특히 돈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가 될 수 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간판도 내걸기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찐코노미] 테슬라, 진정한 성장 시작되나…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826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