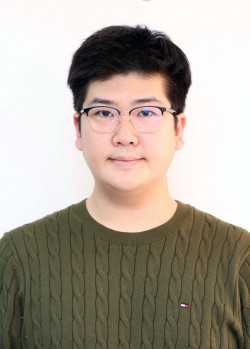
“앞에 불! 라이트! 라이트 안 켜졌어요.”
밤늦게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스텔스 차량’을 만났다. 손짓 발짓, 입 모양을 총동원해 등화장치(전조등·미등 등)를 켜라고 알려준다. 신호가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은 5초 남짓. 운전석의 그는 아직 황당한 표정이다. 포기할까 생각하던 찰나 한 줄기 빛이 암흑을 가른다.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다.
야간에 등화장치를 켜지 않고 도로 위를 누비는 스텔스 차량이 늘고 있다. 상대 레이더나 탐지기를 통해 식별할 수 없는 은폐 기술을 뜻하는 스텔스(stealth)에서 비롯된 ‘스텔스 차량’은 어두운 밤 차량 식별을 어렵게 해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린다.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실 위 사례처럼 알아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도로에서 만나는 스텔스 차량 열에 아홉은 아랑곳하지 않거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운전자들에게 등화장치 미점등을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인 셈이다.
다행인 점은 정부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안전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전조등과 미등을 끌 수 없도록 오프(OFF) 버튼을 없애고, 오토(AUTO)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안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시도보다 운전면허 시험단계에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 사고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사고 발생률은 0.7%로 7개국 평균(0.26%)의 3배에 가깝다.
국제적으로 ‘물면허’라고 지적받는 데도 이유가 있다. 면허를 따더라도 운전 연습을 다시 해야 할 정도인 데다 비상상황이나 2차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교통문화 수준 향상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단계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운전자 간 배려와 양보도 절실하다.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