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5년 단축으로 효과 쏠쏠
페이스리프트도 변화의 폭 확대
1990년대 말. 현대차와 대우차, 기아산업이 자동차 시장에서 3파전을 이뤘다. 각각 30%대 점유율을 나눠갖던 시절이었다.
당시 신차 발표회에는 넥타이를 맨 경영진들이 앞에 나섰다. 그들은 하나같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 투입"을 강조하고는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런 개발비 멘트는 사라졌다.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플랫폼 공유'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차를 내놓다 보니 개발비를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자동차 회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풀 모델 체인지, 이른바 ‘세대 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신차 개발 때는 초기부터 시장을 조사하고 수요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연간 생산량과 가격 범위 등을 결정한다.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가장 유리한 주기가 7년이었던 셈이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본 토요타 등도 7년마다 새 모델을 내놓는다. 이때마다 차의 겉모습은 물론 엔진과 서스펜션, 파워트레인까지 대대적으로 손 본다.
7년 주기의 중간 기점에서는 앞뒤 디자인을 소폭 바꾸는 ‘마이너 체인지’를 단행한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자리 잡은 1.5세대인 셈이다.
차체는 같되 새 디자인을 덧대는 형태다. 한때 메르세데스-벤츠는 마이너 체인지 때마다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7년이었던 세대 변경 주기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이유는 경쟁 심화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새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며 경쟁했기 때문이다. 세대 변경 때 새로운 기술과 편의 장비를 속속 도입하면 자동차의 제품 경쟁력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2010년대 이후 현대차그룹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짧아진 세대 교체 주기도 주효했다.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자리 잡은 1.5세대 즉 마이너체인지는 부르는 이름과 개념도 달라졌다. ‘마이너’라는 부정적 의미를 걷어내기 위해서다. 이를 대신해 긍정적 의미를 담은 ‘페이스리프트’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체 세대 변경 주기가 짧아진 것은 물론, 중간 기점에 단행하는 페이스리프트 역시 변화의 폭을 확대했다. 앞뒤 모습을 화끈하게 바꾸면서 신차 효과를 누리기 시작한 것. 파워트레인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인테리어 역시 이전과 다를 게 없지만 바뀐 디자인 효과가 컸다.

현대차는 2010년대 들어 독일 폭스바겐의 제품 전략을 추종했다. 이 무렵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토요타, 미국 GM은 글로벌 시장에서 각각 1000만 대를 넘게 판매하며 톱3 체제를 굳혔다. 전체 9000만 대 시장에서 35% 수준이었다.
현대차는 빠르게 글로벌 1등인 폭스바겐을 뒤쫓았다. 현대차 이름 앞에 ‘패스트 팔로워(빠른 추격ㅈ)’라는 수식이 뒤따르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폭스바겐이 직분사 방식의 FSI 엔진을 개발하자 현대차도 곧이어 직분사 방식의 GDi 엔진을 내놨다.
2개의 클러치를 바탕으로 개발한 자동형 수동변속기 역시 폭스바겐이 DSG를 내놓았고, 뒤이어 현대차도 같은 방식의 DCT를 개발해 선보였다. 1세대 벨로스터 역시 폭스바겐의 시로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다.
폭스바겐의 세대 변경 전략도 남달랐다. 먼저 1, 3, 5, 7세대 등 홀수 세대에서는 겉모습을 화끈하게 바꾼다. 이때 엔진과 변속기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대로 2, 4, 6세대 등 짝수 세대에서는 디자인 변화 대신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한 파워트레인을 크게 개선했다. 세대 교체 때마다 변화의 초점을 바꾸면서 개발비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이다.

현대차도 유사한 맥락을 따랐다. 5세대 아반떼MD와 6세대 아반떼AD는 겉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6세대 아반떼와 가장 최근에 등장한 7세대 아반떼(CN7)는 같은 아반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디자인과 차 크기가 달라졌다.
아반떼와 쏘나타가 5~6년마다 새 모델을 내놓고 있지만, 중형 SUV는 싼타페는 7년 주기를 이어왔다. 대형 세단 에쿠스는 10년마다 세대 변경 모델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주요 제품마다 새 모델 출시 기회가 각각 시장에 따라 다른 셈이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침체기에 빠졌다. 문 닫은 공장이 속출했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이 기간에 약진했다. 이른바 '슈퍼 신차 사이클' 효과였다.
현대차는 2020년과 2021년, 뒤이어 기아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주력 신차를 쏟아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과 현대차ㆍ기아의 대대적 신차 출시 시점이 맞아 떨어진 것. 2000년대 세 번째 맞은 신차 슈퍼 사이클이었다. 이 기간 신차를 원 없이 쏟아낸 현대차는 엔데믹과 함께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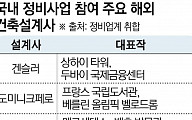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