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30%로 2배가 넘었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다.
보고서가 대기업 척도로 잡은 250인 이상 기준을 국내 기준인 300인 이상으로 바꿔도 ‘일자리 부족’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의 13.8%에 불과하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45.6%나 됐다.
양질의 일자리는 대개 대기업에서 나온다. 그 비중이 세계적으로 낮다는 지표를 허투루 봐선 안 되는 이유다. KDI 분석에 따르면 우선 임금 격차 문제가 있다. 2022년 5∼9인 사업체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그쳤다. 100∼299인 사업체 임금은 71% 수준이다. 2022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86만 원)보다 305만 원 더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KDI 진단이 옳다면 처방은 간단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워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시급한 것은 각종 규제의 혁파다. ‘피터 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걷어낼 일이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성장 사다리보다 규제 보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규제 숫자는 274개로 늘어난다.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총 342개 규제가 적용된다. 암담한 현실이다. 누가 대기업을 꿈꾸겠나. 설혹 성장 사다리가 있다 해도 위로 오르기보다 거꾸로 내려갈 기업인이 줄을 서고 있다.
2011~2021년 미국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이 1.5배 늘 때 한국은 외려 줄었다는 한경협 조사 결과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최근 10년 내 중견기업이 된 300곳에 물었더니 30.7%가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OECD 꼴찌’ 통계는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병리 증상도 치유될 리 없다. 각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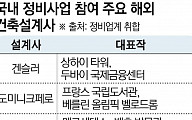


![[찐코노미] ‘D-1’ 美 대선, 초박빙…글로벌 금융시장도 긴장](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74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