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에 환자·치료부담 가중…“정책 수가·전문진료질병군 재분류 시급”

“현재 국내 뇌졸중 치료 체계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환자 수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매년 35만 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은 현재 약 4조7000억 원에서 2050년 약 9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들을 감당할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중 1개 센터에 전문 의사가 1명만 있는 곳도 있다”라며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을 전담하는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동아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뇌졸중 전문의 숫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이런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 증원해야 안정적이다”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높은 업무 강도에 준하는 보상 체계와 정책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지만,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다.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7730원에 불과하다. 뇌졸중 전담 전문의가 대기하거나 영상을 판독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가는 없다.
뇌졸중 급성기 치료는 많은 인력과 설비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질병 분류는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를 꺼리게 되는 구조다.
이경복 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은 필수중증응급 질환이며,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다”라며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누락되는 업무에 대한 정책 수가를 도입해 뇌졸중 분야로 전공의들이 유입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뇌졸중을 치료하는 전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전공의들이 뇌졸중 분야를 기피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다. 특히 배 이사장은 “의사가 많아져도 세세한 시스템이 그대로라면 이도 저도 안 된다”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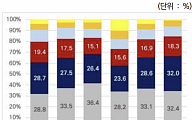

![[컬처콕 플러스] 아일릿, 논란 딛고 다시 직진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5915.jpg)